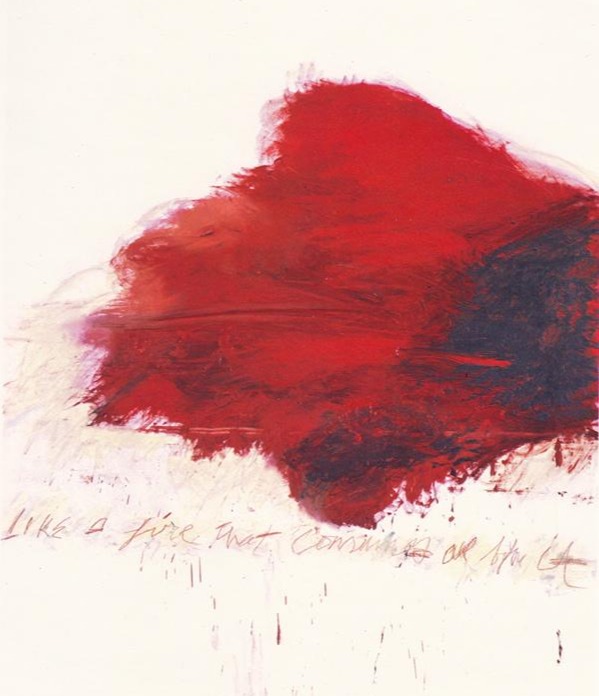분석기사: 이준석과 김문수의 표 같은 듯 다르다.
인터뷰기사: “서울 거주 상층일수록 극우 청년일 확률 높다”
둘 다 전혜원 기자 기사.
현재는 구독자만 볼 수 있는 기사다. 이 블로그에 여러 편 올렸던 청년층 극우화에 대한 글을 보고 연락이 와서 인터뷰를 한 것. 원래는 어느 인터뷰나 그렇듯 제 견해를 말씀드리고 일부 발언을 인용하는 형식이었는데, 인터뷰 전에 한국리서치와 협업했던 원자료를 보내주셔서 이것저것 분석해 볼 수 있었고, 의심만 했지 데이터로 확인하기 어려웠던 청년 극우의 계층적 배경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분석에 상당 시간을 할애했고, 지금도 이것저것 들여다보고 있다.
제공해준 원자료를 논문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허가를 아직 얻지 못했고, 시사인에서 이 자료로 추가 기사를 쓸지도 모르기 때문에, 기사 내용 외의 내용을 말씀드릴 수는 없다.
기사에 이 블로그도 소개되어 있는데, 기사에 대해서 몇 가지 확인을 하자면,
(1) 기사에서 언급한 계층적 배경의 차이에 대해서는 단순 기술통계 뿐만 아니라 다른 변수를 통제한 후의 다변량 분석도 해봤고,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2) 18-34세 연령층에서 극우추정 응답자가 39명 (그 중 36명이 투표했다고 응답) 밖에 안되는데, 비극우 집단과 단순 비교하기에는 표본수가 너무 적은 것 아니냐고 의심하는 분들 있을 것이다. 이것도 모수, 비모수 통계로 계층적 특징과 투표 성향을 검증해봤다.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어떤 건 95% 내지 99% 수준에서, 가구소득과 주관적 계층 인식 모두에서 상층인 경우는 99.9% 수준에서.
(3) 인터뷰 기사에 보면, 회귀분석을 했다는 얘기가 있다. 응답자를 18-34세로 한정한 후, 가구소득*주관적 계층, 성*혼인상태, 지역, 직업, 연령, 종교를 같이 통제한 후, 각 변수를 유의도와 효과의 크기를 봤는데, 가구소득*주관적 계층의 효과가 미혼 여성 대비 미혼 남성의 효과 만큼 컸다. 그러니까 극우 형성에서 성별 효과와 계급 효과가 각각 독립적으로 유사한 사이즈다. 20-30 남성의 극우력은 성별 효과나 계급 효과 하나로 축소시킬 수 없다. 그야말로 젠더와 계급이 교차적(intersectional)이다.
기사 제목에서도 나오듯, 지역별로는 서울 거주자의 극우 확률이 가장 높다. 경기, 충청, 호남 거주 청년은 말할 필요도 없이 확실하게 서울 거주 청년보다 덜 극우적이었고, 비록 통계적 유의도는 낮지만 영남 거주 청년도 서울 거주 청년보다는 효과의 크기면에서 무시할 수 없을 만큼 덜 극우적이었다. 그러니까 지방 취약 청년을 인터뷰하면 이들이 극우적인 생각을 하고 있을 확률은 낮다.
(4) 물론 극우의 정의는 여러가지로 내릴 수 있고, 조작적 정의도 여러가지로 바꿔서 분석할 수 있다. 기사를 위해서 극우를 하나로 정의했지만, 조작적 정의를 일부 바꾸면 결과가 바뀌는지도 체크해 봤다. 여기에 더해서, "우파지수", "극우파지수" 등 극우 더미변수가 아닌 지수도 만들어서 체크해 봤다. 결과는 안바뀐다.
(5) 청년 남성은 극우화되었지만, 청년 여성은 장년 여성보다 훨씬 더 좌파화 내지는 극좌화 되었는지도 의문일 것이다. 그렇지 않다. 좌파 지수도 만들어서 체크해봤는데, 청년 여성과 장년 여성의 차이는 미미하다. 장년 여성과 장년 남성의 차이도 미미하고. 청년 남성만 튄다. 좌우파적 사고 모두에서. 심지어 노년층과 비교해봐도 청년 남성이 튄다.
기사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발견도 있지만, 이건 시사인 기사가 전체 오픈으로 풀리고, 이 자료로 추가 기사가 나오지 않고, 시사인에서 자료 사용을 허가하면 그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