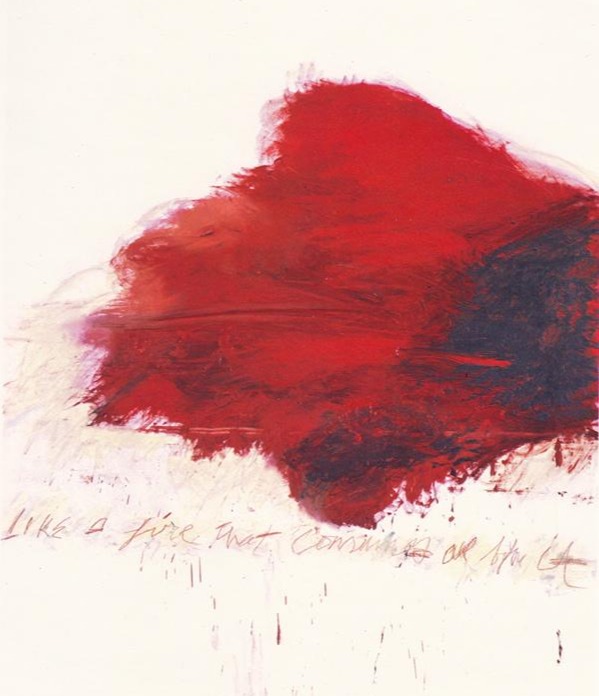Science 논문:Young people’s social mobility expectations in an unequal world
지난 주에 Science에 올라온 논문인데, 아래 그래프 하나로 요약된다. 57개국 15세 청소년의 계층 상승 기대와 현재의 소득불평등의 관계를 봤더니 불평등이 높은 국가일수록 계층인식 기대가 높더라는거다.
저자들이 사용한 원자료는 2022년 PISA다. 소득불평등은 Worldbank 자료고. SES mobility는 부모의 직업지위와 15세 청소년의 성장 후 기대 직업지위 점수의 차이다. 그러니까, 소득불평등이 높은 국가일수록 부모보다 자신의 직업지위와 더 높을 것으로 기대하는 경향이 있다는거다. 주관적 지위로도 분석했는데 결론은 같다.
"위대한 개츠비 커브"라고 기회평등(= 계층이동)은 불평등이 높아질수록 낮아져셔, 불평등과 기회평등은 부정적 상관관계를 가진다는 유명한 법칙이 있다. 이게 객관적 관계다. 그런데 이 논문이 보여주는건, 청년층의 주관적 인식에서는 불평등이 높은 국가에서 사회이동의 기대도 높고, 상향이동할 것으로 기대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다. 객관적 현실과 주관적 인식의 괴리다.

이렇게되는 이유 중 하나는 경제발전과 더불어 사회가 안정되고, 불평등이 줄어들면 (= 쿠즈넷 커브), 절대적 사회이동의 기대가 낮아지기 때문이다. 이 논문의 부록을 다운로드해서 보면, 1인당 GDP와 절대적 사회이동의 기대치의 관계 그래프가 있는데 R2=.81의 확실한 음의 관계이다.
이렇게 경제발전과 사회이동의 관계가 강력한데도, 위의 분석은 경제발전 정도를 통제하지 않은 것이다. 조금 의아했다. 그래서 Sciecne 지에 올라온 저자들의 코드를 다운로드받아서 1인당 GDP를 통제한 후에 소득불평등과 사회이동 기대치의 관계를 별도로 분석해 봤다. 계수값의 정도는 줄어들지만 여전히 불평등이 높은 국가일수록 사회이동 기대치도 높아지는 관계는 상당히 로버스트하게 확인되더라.
사회이동에 대한 주관적 기대는 실체적 사회이동에 의해서 형성되는게 아니고, 그 사회의 분위기를 반영한다. 그리고 기존 연구에 따르면 높은 불평등은 능력주의에 대한 믿음을 강화하고, 사회이동에 대한 기대를 높인다. 달리 말해, 불평등이 줄어들면서 능력주의에 대한 의심이 생기고, 사회이동에 대한 기대가 낮아진다.
한국의 상황에 적용하면, 불평등이 높고 그 때문에 계층이동이 낮았던 시절에는 개천룡의 기대가 높았는데, 불평등이 낮아지고 계층이동이 더 활발해지면서, 개천룡의 기대가 낮아진다는거다.
논문의 후반부에 Benabou의 연구를 인용하며 이런 구절이 나온다. "강력하고 지속적인 경제발전이 이루어지고, 미래 세대의 생활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할 때, 기회평등 향상과 불평등 축소를 위한 정부 개입의 선호는 줄어든다."
한국에서 목도하고 있는 현실과 인식의 괴리, 보수화가 한국적 상황만은 아니라 다행이라고 해야할지. 아니면 이게 보편적 법칙이라 어찌할 도리가 없기에 절망해야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