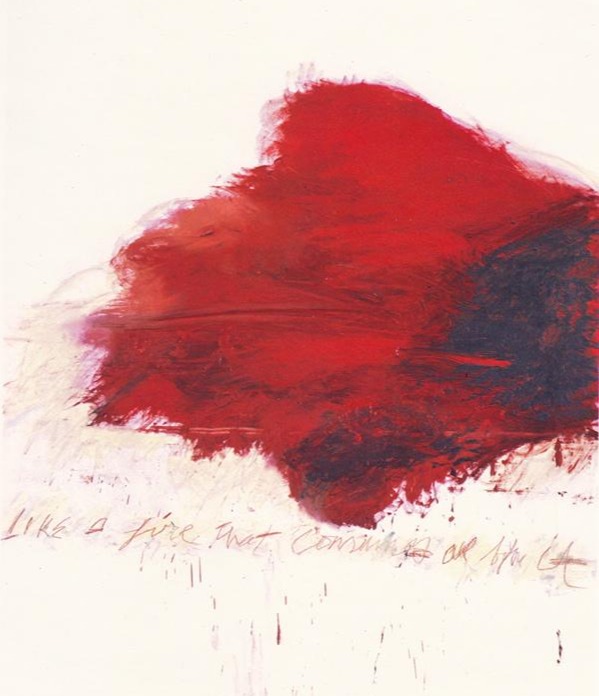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규제에 대한 불만으로 언론이 만들어낸 말이다.
많은 분들이 황당하다며 비난하는데, 생각해볼 거리가 없는 말은 아니다. 정확히 같은 건 아니지만, 관련된 현상에 대해서 잠깐 연구를 했었다. 학회에서 발표만 한 번 하고, 연구를 마무리 짓지는 못했지만, 물들어올 때 노젓는다고, 블로그에 포스팅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고소득-흙수저를 좀 더 학술적으로 규정하면, 소득 상층 & 자산 하층이라고 할 수도 있고, 소득의 랭크가 자산의 랭크보다 높은 집단이라고 할 수도 있다. 자산은 상속의 영향이 소득보다 당연히 크다. 그렇기에, 한국에서 계층이동이 활발하다면, 통시적으로 고소득-흙수저가 늘어나야 한다. 흙수저 집안에서 고소득자가 나오는게 상향이동이니까. 반대로 계층이동이 별로 없다면 자산-소득의 연계가 공고하고, 변화가 없어야 한다.
베버는 소득 계층과 자산 계층이 일치하지 않는 것을 지위불일치(status inconsistency)라고 했다. 계층이 전반적으로 공고화되어 있어서, 상속계급이 아니면 인정하지 않는 국가에서는 계층 상향 이동을 한 집단이 자신을 상층의 일원으로 받아주지 않는 사회에 불만을 가지고 정치적 진보로 이어지고, 계층이 덜 공고화되고 계층에 따른 별도의 아비투스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국가에서는, 소득이 높아질 때 상층의 일원으로 부담없이 받아들여져, 계층 상향 이동에 따른 지위불일치가 별로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정치적 보수로 이어진다는 사회학의 고전적 연구도 있다.
어쨌든 한국에서 계층이동이 활발하다면, 통시적으로 고소득-흙수저가 늘어나야 한다. 반대로 한국의 계층이 점점 더 상속된다면 고소득-흙수저가 줄어들고, 자산과 소득의 지위가 일치하는 고소득-금수저, 저소득-흙수저가 늘어나야 한다.
아래 그래프는, 가금복 자료를 이용해서, 전체 가구의 자산과 소득을 5개 분위로 나누고, 40대 이하에서 소득과 자산 분위의 일치 비율을 살펴본 것이다. I=A가 소득과 자산의 분위가 일치하는 경우이고, I>A는 소득 분위가 자산 분위보다 높은 고소득-흙수저이고, I<A는 자산 분위가 소득 분위보다 높은 저소득-금수저이다. 보다시피, 고소득-흙수저의 비율이 20% 가까이 늘었다.

40~50대도 마찬가지다. 고소득-흙수저의 비율이 30% 가까이 늘고 소득과 자산의 랭크가 일치하는 비율이 줄었다. 저소득-금수저도 비슷하게 줄어들었다.

이 분석은 한국에서 계층 이동이 활발하다는 증거이다. 상속의 영향이 강한 자산 부자가 소득도 높은게 아니라, 자산은 없어도 소득은 높은 청년, 장년층이 많다. 이 분석의 또 다른 함의는 흙수저 출신으로 소득은 높아졌는데 자산은 여전히 없어서, 이에 대한 불만이 높은 계층이 증가하고 있을 가능성이다. 최근에 모두가 소득 불평등 보다 자산 불평등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이유 중 하나가 이 때문일 것이다.
주택문제로 넘어가자면, 괜찮은 주택의 공급을 늘려서 고소득-흙수저의 니즈를 채워줘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괜찮은 주택이라는게, 지역균형발전을 통해 지방의 주택 가치를 높이는 것이 될지, 서울과 수도권 추가 개발을 통한 것일지는 정책적 선택의 문제겠지만, 이 니즈가 있다는 것을 부인하기 어렵다.